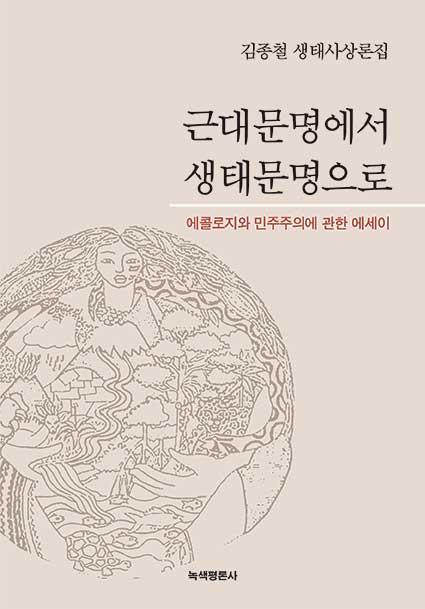격월간 《녹색평론》 100호를 맞이하여, 창간호부터 발행·편집인이 쓴 서문을 한 권으로 묶었다. 《녹색평론》이 이상주의적이거나 심지어 근본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잡지라고 생각한다면 일독을 권한다. 기후변화, 피크오일, 식량위기 등의 생태위기, 사회적 격차와 권력 독과점, 인간관계의 파괴, 인간성의 황폐화가 극에 달한 오늘날 문명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보다 더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
목차
책머리에
1부
생명의 문화를 위하여―창간사
변화는 나 자신부터
두려운 것은 가난이 아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지속가능한 개발’ 논리의 허구
생명의 그물
농촌공동체의 재건이 급선무이다
선거와 풀뿌리 주권의 회복
世界는 하나의 꽃
욕망의 교육
핵과 자동차, 그리고 쓰레기
쌀 문화의 종언
희망을 위한 싸움―자동차에서 자전거로
생산력이 아니라 공생의 윤리를
시골학교의 폐쇄가 뜻하는 것
삼풍백화점 붕괴를 보며
컴퓨터기술, 구원인가 저주인가
‘고르게 가난한 사회’를 향하여
어떤 寓話
살생으로 유지되는 경제
IMF 사태에 직면하여
기술의학 체제를 넘어서
물신주의와 생명공학
연대의 그물을 위해서
9·11 테러와 ‘미국식 생활방식’
월드컵 경기와 공동체
‘선진국’이란 과연 무엇인가
해방 60년, 우리는 과연 성공했는가
‘수돗물불소화’를 우려하는 발행인의 편지
‘국익’ 논리의 함정
한미FTA와 민주주의의 위기
사상누각의 꿈―한미FTA가 가져올 재앙
2부
땅에 뿌리박은 지혜
질병으로서의 경제학
상상력의 빈곤
농업의 쇠퇴와 지식인
무위당과 공경의 사상
대학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안락을 위한 전체주의
뿌리내리기
소농의 옹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대화의 완성과 자멸
본문 중에서
[머리말]
격월간 《녹색평론》이 100호를 맞이하여, 그동안 이 잡지의 발행·편집인으로서 내가 써왔던 서문, 즉 ‘책을 내면서’를 한권의 책으로 묶어보자는 아이디어가 편집실에서 나왔고, 그 결과가 이 책이 되었다. 말하자면, 이것은 《녹색평론》 100호 발간 기념사업의 일환인 셈이다.
책이 나올 때마다 서문을 썼더라면 당연히 100편이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매번 서문을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일부러 작정한 것은 아니지만, 근래 《녹색평론》의 서문은 좀더 독립적인 에세이로서 읽힐 만한 것이 더러 있었고, 그래서 그런 글들은 지금 이 책과 함께 따로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책 《땅의 옹호》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 결과, 《녹색평론》 이외에 다른 지면에 발표했던 몇 편의 짧은 글들을 추가하여 이 문고본 형태의 책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넘쳐나는 서적 시장에 또하나의 시시한 인쇄물 하나를 보태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막상 책을 내놓으면서, 보잘것없는 책이지만, 제 딴에는 꽤 절실한 기분으로 썼던 글들이라, 가급적 많은 좋은 독자들을 만나 공감 속에 읽혔으면 하는 염치없는 욕망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책을 엮기 위해서 해묵은 글들을 다시 꺼내놓고 읽어보다가 두 가지 점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첫째, 내가 《녹색평론》의 서문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따지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생각으로 일관해있다는 점이었다. 요컨대,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빙산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갈수록 짙어지는 상황에서 배의 항로를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보다도 더 상식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흔히 《녹색평론》이라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거나 심지어 근본주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잡지라고 믿는 경향이 아직도 있다. 《녹색평론》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지만, 《녹색평론》에 어느 정도 친숙한 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이런 선입관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마도 그것은 일차적으로 생각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탓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상식으로서 통용되기를 허용하지 않는 우리시대의 ‘근원적인 어둠’ 탓일지 모른다.
내가 받은 또하나의 충격은 이미 오래 전에 썼던 글들이 지금 상황에서도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아니,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오래 전에 쓴 서문들 가운데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서 더 절실하게 읽힐 만한 것이 많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지난 17년간 본질적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거나 혹은 질적으로 더 열악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후변화, 피크오일, 식량위기, 그로 인한 필연적인 세계경제의 붕괴라는 가공할 전망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급속히 파국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이 세계는 이미 10년 전, 20년 전의 상황과도 다르다. 이미 우리가 탄 배가 빙산에 부딪치는 것을 더이상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사라졌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격차와 권력의 독과점은 날로 심화되고, 교육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민주주의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다운 덕성과 자질을 뿌리로부터 부정하는 물신주의(物神主義)의 일방적인 위세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는 인간관계, 그에 따른 인간성의 황폐화 … ‘근대의 어둠’은 훨씬 더 깊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 하나하나를 나는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썼다.
나는 이 책이 나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이웃들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고, 나아가서 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작은 끈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묶었다.
2008년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