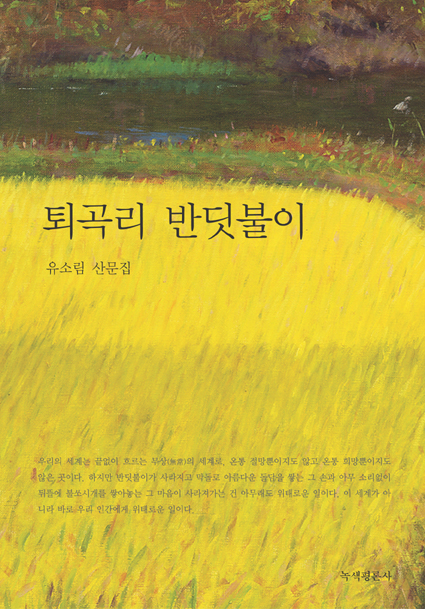시인 유소림의 산문집. 2005년 강원도 강릉 퇴곡리로 이주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저자는 인간인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저 벌레와 풀의 은덕임을 가슴 치며 절감했다고 고백한다. 그는 다만 지구별에 사는 목숨붙이들과 어울려 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려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현실에 절망하여 난폭해져가는 우리의 영혼을 위무해준다.
목차
책머리에 | 곳간에 쌓아두지 않아도
1부. 퇴곡리 듬바위골 분교
퇴곡리 듬바위골 분교
벌들 죽어가는 날에
뒤뜰의 순례자들
겨우살이
뱀
나비
뱀허물쌍살벌
구름이에게
머위를 따며
퇴곡리 반딧불이
메밀 수업記
떠나는 나의 동무들에게
집
알 수 없는 그이께서
2부. 엄마의 수선화
꾸아리
엄마의 수선화
수국 꽃잎은 그리 푸르러
들국화
감나무
그 여름의 쏙독새
아버지의 꽃
진주
3부. 저 들녘 벼이삭
菊日閑人
불행한 오리 새끼
옛 무덤 지나는 길에
발자국
작은 젖먹이짐승을 그리워함
산 것들, 죽은 것들
‘약수터’ 가는 길
벼룩이자리, 하얀 풀꽃
아파트의 새 풀잎
돼지가 전해준 패랭이꽃
장미보다 아름다운 꽃
하늘 나팔꽃
눈보라
당신 보시기 좋으신 계절
싸리비
저 들녘 벼이삭
절
포르노 국화
태극기
구름이
등에
4부. 캄보디아 여행기
캄보디아 여행기
추천의 말
유소림은 《녹색평론》을 통해 알게 된 시인이다. 그의 시나 산문이 실리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가 퇴곡리 시골로 가서 직접 농사지으며 쓴 글을 읽으면서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친밀감마저 느꼈다. 그 집 마당에서 피고 지는 제비꽃, 도라지꽃, 나리, 구절초, 머위 등과 우리집 마당의 그것들과 남남이 아니듯이.
나이는 내가 많을 성싶은데도 형님이라 부르고 싶은 것은 나는 흙을 이르집다가 굵은 지렁이만 나와도 뒤로 나자빠질 뻔하는데 그는 곧잘 뱀도 길들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둘이 다 흙 만지기를 좋아한다고는 하나 그는 먹을 것을 가꾸니까 농사이지만 나는 잔디나 꽃 가꾸기에만 매달려 있으니 흙장난에 불과한 것도 그보다 한수 아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한다.
《녹색평론》을 창간호부터 꾸준히 애독해 오면서 깨우치고 배운 것도 많다. 그 잡지의 일관된 논조는,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이 시키는 대로 달리는 이 무한경쟁의 시대를 향해 제발 자연과 이웃으로부터 덜 뺏고 덜 소비하고 덜 빠르게,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가난하고, 단순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고, 지구와 인간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이라고 외치는 데 있는 것 같다. 그 방면의 국내외의 연구자, 이론가들의 설득력 있는 글이나 연설문을 폭넓게 접한 것도 《녹색평론》 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글에 깊이 공감은 하지만 위로는 받지 못한다. 이대로 가다간 대재앙이 닥쳐와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낄 적도 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땅에 엎드려 노동하는 생활을 하는 유소림의 글은 그런 공포감을 서늘하게 비켜가면서 부드럽게 위로해준다. 단 몇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는 않겠다는 성경말씀도 있지 않은가.
─ 박완서(작가(작고))
본문 중에서
날이 추워져 마당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 불쏘시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내 모양을 보더니 김 사장이 다시 아저씨를 부른다. “어이, 이씨, 사모님 나무 좀 해드려.” 아저씨는 언제 어디서건 온갖 잡동사니 일을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진짜 잡부’라는 걸 증명하기라도 하듯 어디선가 손도끼를 꺼내들고 와 나무를 한다. 예쁜 손도끼였다. 아저씨는 놀이하는 아이처럼 손도끼를 반짝이며 즐겁게 일을 한다. 금방 사과상자 수북이 잔가지들이 쌓였다. 아저씨가 돌아가고 난 뒤에 보니 뒤뜰에도 아저씨의 손도끼만큼이나 예쁜 불쏘시개 더미가 무슨 설치예술품처럼 놓여 있었다.
쟁쟁한 쟁이들에게도 대접이 시원찮은 요즘 세상에 ‘쟁이’도 아닌 ‘잡부’라는 이름을 달고서도 그렇게 즐겁게 일하고 그렇게 천진한 웃음을 보일 수 있는 그 아저씨. 자신의 이익과 그다지 관련도 없고 하찮기만 한 일에도 자연스런 정성이 우러나는 사람. 이씨 아저씨는 도시 아스팔트 위에 홀연히 나타난 노랑나비를 생각나게 했다. … 우리의 세계는 끝없이 흐르는 무상(無常)의 세계로, 온통 절망뿐이지도 않고 온통 희망뿐이지도 않은 곳이다. 하지만 반딧불이가 사라지고 막돌로 아름다운 돌담을 쌓는 그 손과 아무 소리 없이 뒤뜰에 불쏘시개를 쌓아놓는 그 마음이 사라져가는 건 아무래도 위태로운 일이다. 이 세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 위태로운 일이다.
– <퇴곡리 반딧불이> 중에서
우리는 부모 무덤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세뱃돈 받는 어린 딸들처럼 제상의 과일을 내려 나누어 먹었다. 엄마, 동생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모두 즐겁게 지내요. 큰언니가 그런 소릴 했다.
나는 언니들을 새삼 다시 바라보았다. 언니들은 길에 나서면 골목이 훤해질 만큼 곱던 여자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굳셌던가. 5·16 쿠데타 이후 아버지가 쫓기고 숨어 다녀야 했던 십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언니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학교를 다녔고 일자리를 구했다. 그런 언니들이 어느새 앞머리 언저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눈가에 실주름이 잡혀있다. 모두들 소복이 어울리는 나이가 된 것이다. 어미 잃은 딸들이 이제 스스로가 어미가 된 것이다.
– <들국화> 중에서
수염을 길러 할아버지의 행색이 된 아버지는 약수 물도 떠오고 논두렁 밭두렁을 걸어 멀리 산책도 나가고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독서를 했다. 아마도 그 책들은 전부가 ‘무시무시한’ 금서였을 게였다. 지금에야 그런 책들 무시무시하기는커녕 대낮 한길 바닥에 활짝 펼쳐져 있다 해도 지나가는 강아지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고 말았지만 당시의 아버지에게 그 독서는 자신의 혼신을 다한 일이었을 것이다.
– <아버지의 꽃> 중에서